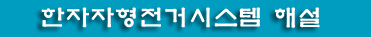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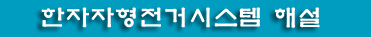
《全韻玉篇》은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저자와 편찬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1796년(정조 20)에 서명응(徐命膺)·이덕무(李德懋) 등에 의하여 편찬된 《奎章全韻》의 부편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214부수 17획으로 나누어 매자마다 字形, 國音, 한문주석, 운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全韻玉篇》의 국음과 한문주석은 《奎章全韻》보다 한층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솔 최현배는 《全韻玉篇》에 대해 “이 책은 전혀 운서로부터 독립하여 운서를 빌지 아니하더라도 능히 글자의 음과 글자의 뜻을 찾아보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립적 옥편의 선구를 지은 것이라 할 만한 것이다” 하였다.
《全韻玉篇》에는 《奎章全韻》의 음, 俗音, 《通釋韻考》의 음 등의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다. 李忠九는 이를 근거로 《奎章全韻》이 규범음만을 수록한 데 반하여 《全韻玉篇》은 속음까지도 제시하여 실용에 보다 유용케 했다고 한다.
《全韻玉篇》에 수록된 한자는 모두 12,782자로 확인되었다. 이 중 유니코드 BMP와 EXT_A 영역으로 입력할 수 있었던 한자가 12,081자였고 입력할 수 없었던 한자가 701자였다.
다음은《全韻玉篇》에 관해 연구한 논저들이다.
|
金根洙(1974), 全韻玉篇, 韓國學 2. 안병호(1959),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의 표음, 조선어문 3. 李氣銅(1982), 全韻玉篇에 注記된 正俗音에 대하여, 語文論集(高麗大) 23. |
《隸書集成》은 손환일 선생이 1995년에 편집한 예서자전이다. 손환일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伏見冲敬 編, 『隸書大字典』, 佐野光一 編, 『木簡字典』, 洪釣陶 編, 『隸字編』, 北川博邦 編 『篆隸大字典』, 顧南原 編 『隸辨』 등과 한국자료를 토대로 예서를 망라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한국자료에는 낙랑의 《점제현비》, 고구려의 《광개토왕비》, 《명문전》, 고려의 《선각왕사비》, 조선의 유한지, 조광진, 김정희 예서 등이 있다. 중국자료에는 漢나라 시대의 石刻資料인 《楊量買山地記》, 《魯孝王刻石》, 《石門頌》, ·《孔宙碑》, 《西狹頌》 등 172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木簡, 帛書, 殘紙자료인 《馬王堆帛書》, 《敦煌帛書》, 《敦煌漢簡》, 《居延漢簡》 등 17개소에서 출토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魏나라 시대의 石刻資料인 《受禪表》, 《孔羨碑》, 《正始石經》 등 18종, 晉과 前秦의 石刻資料인 《石定墓誌》, 《張永昌墓碑》 등 28종, 明·淸의 諸家 墨筆本인 徐眞木, 王澍, 金農, 丁敬 등 200여명의 예서가 수록되어 있다.
한자전거시스템에서 이 자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자전거시스템이 한적자료 입력의 기준을 마련하는 도구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간체자까지 한자는 자연발생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자형의 변천이 있었으므로 한자의 자형 변천사를 이해하고 나서야 올바른 한적자료 입력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상형문자인 이집트 신성문자(hieroglyphic writing)는 일용에서는 상형의 형태가 추상화된 승용문자(hieratic writing)로 발달하고 후대에는 더 간략하게 흘려 쓴 형태인 민용문자(demotic writing)로 발달하는 것처럼 상형문자인 한자 역시 갑골문자, 금석문자, 소전, 예서, 해서의 발달을 거쳐 오늘날 중국의 간체자가 발달하게 되었다. 간체자에 나타난 자형변화는 다소 인위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예서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자형의 형태변화, 해서로부터 서사의 간이성을 위해 발생된 자형변화의 원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상형문자인 한자의 자형변화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가 무수히 발생되어 이 중 보편화된 변화만이 비로소 자형의 변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한자전거시스템에서 자형변천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무수히 많은 자형 변화 중 개인적인 것을 걸러 내기 위함이다.
금년도 사업에서 자형변천사에 관심을 갖는 한자는 다음의 24개 한자이다. 이들은 변사자로 형태가 유사하고 음과 뜻은 현저히 구별되는 글자들이다.
| 佳 (가,4F73) | 隹 (추,96B9) | 疆 (강,7586) | 彊 (강,5F4A) | 揵 (건,63F5) | 犍 (건,728D) | 苟 (구,82DF) | 茍 (구,830D) | 欹 (의,6B39) | 歌 (가,6B4C) | 刺 (자,523A) | 剌 (랄,524C) | 屇 (전,5C47) | 屆 (계,5C46) | 挺 (정,633A) | 挻 (연,633B) | 啇 (적,5547) | 商 (상,5546) | 壺 (호,58FA) | 壼 (곤,58FC) | 愽 (박,613D) | 慱 (단,6171) | 戻 (태,623B) | 戾 (려,623E) |
다음은 금년도 사업에서 구축한 자형변천사의 설명자료이다. 금년도 사업에서는 한학과 서예에 조예가 깊은 동서울대의 홍순목 교수와 손환일 선생님이 자형변천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의 글은 홍순목 선생님의 초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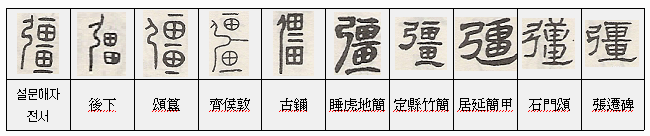
|
금문상의 彊과 小篆상의 彊은 대체적으로 같다. 小篆의 彊은 弓과 畺을 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弓은 힘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畺은 본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탈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힘과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기인 활이라는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彊의 뜻이 强과도 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高樹藩, 『中文形音義綜合大辭典』(北京: 中華書局, 1989) p. 430. 참조.) 다만 强의 의미로서 彊이 드물게 사용된 것은 强보다도 彊이 書寫 상에 있어서 번거로운 탓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
《字彙》는 명나라 학자 梅鼎祚가 萬曆 43(1615)년에 편찬한 14권 14책의 字典이다. 이 자전은 《康熙字典》의 편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전의 第 一卷에 옛 자형을 따라야 할 ‘從古字’ 179자, 당대의 자형을 따라야 할 遵時字’ 109자, 옛 자형과 당대의 자형을 통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古今通用字’ 132자가 제시되고 있다. ‘從古’란 본 뜻을 유지하기 위하여 古形을 택해서 써야 하는 것을 말하며(古人六書 各有取義 遞傳於後 漸失其眞 故於古字當從者 紀而闡之), ‘遵時’란 新形이 일반화 되어 고형을 버리고 신형을 써야 하는 것을 말하며(近世事繁字趨便捷徒拘乎 古恐淚於今 又以今時所尙者酌而用之), ‘古今通用’은 신형과 고형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한 것을 말한다.(博雅之士好古 功名之士趨時 字可通用 各隨其便)
《字彙》에 제시된 俗字에서 보여지는 자형의 형태변화는 어느 일 개인의 것이 아니다. 복잡한 한자 자형을 간편하게 서사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변화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서 믿을 만하다. 따라서 한적자료의 전산화에 참고될 만하다. 고형인 정자와 신형인 속자간에 보여지는 자형의 형태변화의 주요 특징들이 근대에서 정립된 중국의 간체자의 경향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다음은 《字彙》에 제시된 從古字와 古今通用字의 일부이다.
 |  |
장서각에는 1930년에 간행된 油印版의 《正子俗字對照表》 2책(K1-210,K1-216)이 소장되어 있다. 두 책은 완전히 같은 책이다. 이 책은 표지가 2장이고 내용이 24장이다. 1930년에 작성된 실록편찬실의 例言, 정자속자 대조표, 통용속자 대조표, 조선고유자 목록, 틀리기 쉬운 글자의 대조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500자의 정자에 대한 속자가 제시되어 있으며 36자의 통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속자, 13자의 조선고유자, 34종의 착각하기 쉬운 글자가 제시되어 있다.
例言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록편찬실에서 이 책을 편찬한 동기는 왕조실록의 편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검사의 간편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예언에 기술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2,500자의 정자에 대한 속자를 추출한 전거는 강희자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왕조실록의 규범적 성격 때문에 2,300자의 속자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속자를 단순히 속자라 하지 않고 通俗訛謬字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통용속자는 비록 정자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틀리기 쉬운 글자[易誤字]를 글자의 획이 유사하나 아니고, 가까우나 다르고, 잊기가 쉽고 잘못 보기가 쉬운(易誤字 字劃 似而非 近而異 忘亦易 誤亦易) 글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책이 검사의 간편한 도구를 마련코자 함에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似而非’와 ‘近而異’는 《강희자전》에서 말한 辨似字의 개념과 일맥 상통하나 ‘忘亦易 誤亦易’는 역시 교정의 편이를 위한 것이다. ‘泰, 奏 , 舂 , 卷, 券, 眷’등이 易誤字의 예이다.
‘已’와 ‘己’처럼 ‘辨似’란 음과 뜻이 현저히 구별되나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섞여 쓰일 가능성이 높은 글자를 말한다. 《字彙》에 二字相似 212종, 三字相似 7종, 四字相似 5종, 五字相似 2종이 소개되고 있으며 《康熙字典》에 二字相似 366종, 三字相似 25종, 四字相似 9종, 五字相似 1종이 소개되고 있다.
한자에서 변사자(辨似字)의 존재는 한적자료의 입력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한다. 특히 필사본 한적자료에서는 형태상의 미세한 차이가 간과되기 쉬우므로 씌여진 한자를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판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변사자의 목록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 된다.
다음은 《자휘》와 《강희자전》에 제시된 변사자 목록의 일부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7년 동안 지식사업에 참여하여 그동안 3,800여책의 한적자료 1억 2천만자를 DB구축하여 인터넷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중 약 60%는 세그멘트 공법으로 구축되었고 구축의 부산물로 산출된 자형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다. 이 자형 이미지는 실생활에서의 우리의 한자생활을 밝혀주는 귀중한 재료로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에는 24자에 대한 자형전거자료만 구축할 예정이다.
《字典釋要》는 松村 池錫永이 1906년에 탈고하여 匯東書館에서 1909년에 간행한 자전이다. 이 자전은 아동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奎章全韻》이 풀이한 중요한 뜻을 따라 국음과 국의를 제시하고 있다.
총 16,295자를 수록하였고 《康熙字典》,《全韻玉篇》의 214부수 17획과 획수순 배열을 따라 글자를 배열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속자를 구별하여 제시한 것은 한자 자형의 변천 연구에 중요한 재료로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字典釋要》에 대한 연구논저이다.
| 崔範勳(1976), 字典釋要에 나타난 難解字釋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0. |
訂正增補 《新玉篇》은 정익노가 1911년에 간행한 한자자전이다. 1908년 송남 김원극이 쓴 ‘국한문신옥편’, ‘국한문신옥편총목’, ‘옥편’, ‘정정증보신옥편보유’ 등과 부록으로 ‘음운자휘’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의 ‘訂正增補’으로 보아 《新玉篇》의 이전 판이 1908년 이후에서 1911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자전에는 12,665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정증보신옥편보유’에는 주로 ‘古字’가 중심이 되어 수록되어 있다. ‘古字’의 경우에는 전산화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입력하지 않았다.
《新字典》은 朝鮮光文會에서 1915년에 편찬한 字典이다. 六堂 崔南善이 편찬을 주관하고 訓釋은 한힌샘 周時經, 白淵 金枓奉 등이 담당하고 그 외 다른 분야는 石儂 柳瑾, 肯沙 李寅承, 圓泉 南基元 등이 담당하여 만든 것이다. 崔南善의 《新字典敍》에 따르면 당초에 大字典으로 기획된 것이나 稽古記事와 日用普通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小字典으로 먼저 간행하게 된 것이다.
字次는 《全韻玉篇》을 따랐기 때문에 《康熙字典》과 같은 214부수 17획에 획수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형, 자음, 자의, 용례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으며 글자들은 3단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같은 《新字典》의 체례는 1912년에 간행된 중국의 《新字典》의 체례와 동일한 양식이다.
光文會의 《新字典》에는 조선속자 106자가 풀이되어 있으며 일본속자 97자가 풀이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또 한문 주석에 대응되는 우리말을 가급적 많이 싣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의어 풀이들이 많이 있음이 특징이다. 유의어 뿐만 아니라 방언형과 고형도 수록된 점도 큰 특징이다. 또한 500여 단어는 고어사전에 나타나지 않는 고어들로 현재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다음은 卷一에 나타나는 難解語들이다.
| (1) | 家(%나나/남편/셔방), 嫁(싀집갈/%갈밀), 姦(간사할/%난밀), 康(편안/편안할/%다늘), 巨(억/%온울), 傑(%넌구/쥰걸), 姑(고모/%으나), 公(공변될/%아즐), 巧(교할/%다릇을), 交(흘에할/%암굴), 局(량/%아만), 券(계약셔/%노시), 基(업/%밋졀미), 吉(길할/%노질), 寧(편안/%다늘), 啖(%통이 삼킬), 代(%멉/대수), 凍(%솔/얼), 廉(%서실), 廉(청렴할/%알밀), 囹(옥/%남두), 弄(희롱할/%몬실), 寮(동관/%스삼), 吏(%인가/아젼), 利(리할/리로울/%던을), 幕(군막/%모락), 妙(묘할/%압을), 兵(군사/%다람), 堡(작은셩/%노잣), 幞(%치마무), 俸(록/료/%느름), 富(감열/넉넉할/%붑을/만을), 婦(제어미/안에/%미미), 史(%악/사긔), 士(선비/선배/%드만), 喪(죽을/%굿길), 庠(태학/%고남), 塞(변방/%도누/설미), 庶(%담아들), 壻(사위/%다수/%기루), 婿(사위/%다수/%기루), 序(학교/%고남), 仙(%이노/신션), 姓(%억/씨/셩), 俗(익음/버릇/%함보/풍쇽), 孫(손자/아들의 아들/%나느), 壽(목숨/%므리), 帥(쟝슈/%가담), 塾(글방/%고남), 實(%사본), 堊(색흙/%모록), 犴(우리/%욱), 安(편안할/%다늘), 厄(액회/재앙/%미즐), 圄(옥/%남두), 億(%즘잘/억), 嚴(엄할/%그굴), 員(관원/%무내), 姨(이모/%자스), 因(인연/%안시), 壬(븍방/%노), 灼(졸/%자즐), 奠(뎡할/%늑을), 廛(저자방/%누달/젼자리), 囀(후렴/%슴나), 定(뎡할/%근을), 姪(%다미/족하), 冊(책/%앗), 哨(방슈군/%걱개), 囑(부탁할/쳥쵹할/%스미슥을), 催(재촉할/%서질), 層(층/겹/%헙), 嘆(한숨쉴/%서밀), 塔(탑/%설암), 便(편할/%다늘), 平(%어셩군/즁도위), 弊(모질/%거수), 儤(%쥬도번잘), 品(%바테/벼슬차례), 品(%/가지), 學(학교/글방/%고남), 婬(간음할/%슬굴), 嶮(산가파를/%걱을), 俠(의긔/%머누), 刑(형벌/%듭), 幻(요술/%늘김), 候(망군/%눌미), 寛(노흘/%두남둘/용서할), 犆(%선두를) |
(1)에 제시된 단어들 중 %가 표시된 것이 난해어들이다. 이들 난해어의 출전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못하다. 기왕의 연구에서 일부 단어에 대해서 출전이 연구되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다. (1)의 단어들은 대부분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 수록되었는데 편자가 출전을 확인하고 등재했는지는 미상이다. 《新字典》에 수록된 자석을 비판없이 수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나나’는 남편의 옛말로 풀이하고 있으나 그 출전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1)의 뜻풀이들은 실재로 우리 말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四方位의 字釋이 신자전에 다음과 같이 풀이 되어 있다.
| (2) | 東 (日出方 %시/동녁/오른), 西 (日入方 %하/셔녁), 南 (午方 %마/압/남녁), 北 (朔方 %노/뒤/븍녁), 壬 (븍방/%노) |
(2)에 나타난 난해어들은 인공어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아래 성호사설의 기사는 난해어들이 인공어가 아님을 말해 준다.
| (3) | 그리하야 나는 우리 말에 東方을 ‘시’라 하고 西方을 ‘한’이라 함으로 三國時代의 學者들이 漢字를 취하야 吏讀字를 맨들 에 西字의 음 ‘시’를 취하야 東을 西로 쓰며 그 대신에 西를 東으로 쓰어 東西 兩字가 박귀엇스며 史家가 史冊을 지을 에 그 박구인 東西 兩字를 써슴으로 古史上에 박구인 東西 兩字가 잇슴이라는 假定을 세웠다. [申采浩 朝鮮史硏究抄 3절 東西 兩字의 박구인 原因의 假定] | (4) | 그朝鮮語에 東을 ‘시’라 함은 ‘新’을 의미함이요 西를 ‘하’라 함은 ‘遠’을 의미함이니 이는 먼 西方에서 새로 東으로 왔음을 表한 것이요 南을 ‘마’라 함은 ‘對面’을 의미함이요 北을 ‘노’라 함은 高處를 의미함이니 이는 北方 高原地로부터 南을 향하여 進入하였음을 表한 것이며 또 別로 南을 ‘앏’이라 하고 北을 ‘뒤’라 함은 더 明白히 民族 移動의 方向을 보인 것이다.[崔南善 兒時 朝鮮(1930)] | (5) | 홍기문의 비판 가. 조선일보 1935.2.5. 나. 조선일보 1935.2.6. |
(6) | 방종현의 논증(한글 7권 2호 1939) 가. 加派島 方言 가) 샛족으로 타라(動向하게 하여라) 나) 하늬쪽으로 타라(西向하게 하여라) 다) 마쪽으로 타라(南向하게 하여라) 나. 성호사설의 사방위 고유어 가) 東風謂之沙 卽明庶風 나) 東北風謂之高沙 卽條風 다) 南風謂之麻 卽景風 라) 東南風謂之緊麻 卽景明風 마) 西風謂之寒意 卽閭闔風 바) 西南風謂之緩寒意 或云緩麻 사) 西北風謂之緊寒意 卽不周風 아) 北風謂之後鳴 卽廣寒風 |
‘南’의 자석으로 제시된 ‘마’는 가파도 방언으로 보아 바른 자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東’의 자석 ‘시’와 ‘西’의 자석 ‘하’ 또는 ‘하’과 ‘北’의 자석 ‘노’ 또는 ‘노’은 ‘새[沙]’, ‘하늬[寒意]’, ‘높새[高沙] 등과는 어형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노’를 ‘뱃사람들의 북쪽을 가리키는 은어’로 풀이한 것처럼 그 용례가 방언이나 고문헌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옳다’와 ‘외다’와 연관을 가진 것처럼 ‘높다’가 ‘북쪽’과, ‘다’가 ‘동쪽’과 연관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東’을 ‘오른쪽’으로 파악한 《新字典》의 자석은 주목할 만하다. 한문을 우리화 시켜 이해한 점이 한자전거시스템에서 신자전의 자석자료를 다루는 이유이다.
다음은 《新字典》에 관한 연구논저들이다.
|
徐在克(1976), 新字典의 새김말에 대하여, 國文學硏究(曉星女大) 5. 吳鍾甲(1975), 新字典의 漢字音 硏究, 嶺南語文學 2. 柳穆相(1974), 朝鮮光文會 編 '新字典', 韓國文 2. 이호천(1976), '新字典' 에 나타난 새김말의 形容詷 硏究 -類義語를 중심으로-, 啓明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황선봉(1976), '新字典' 用言에 訓釋 硏究, 啓明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訓蒙字會》는 1527년 최세진이 아동의 한자학습을 위하여 편찬하였다. 《訓蒙字會》는 3,360자에 대한 釋과 音을 天文, 地理, 花品, 草卉,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昆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 人類, 宮宅, 官衙, 器血,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葬,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 雜語 등 3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訓蒙字會》에 관한 연구 논저들이다.
|
金根洙(1959), 校本訓蒙字會(付索引). (油印), 東國大學校 金根洙(1971), 訓蒙字會, 異本攷, 學術院論文集 10. 金根洙(1977), '訓蒙字會'의 語學的 考察 序說, 韓國學 15 16. 金根洙(1979), 訓蒙字會 硏究, 靑鹿出版社. 金斗滉(1990), '訓蒙字會' 凡例의 字母 排列順序에 대하여, 靑坡 徐楠春敎授 停年退任紀念 國語國文學論文集, 慶雲出版社. 金敏洙(1956), '訓蒙字會' 解題, 한글 119. 金永信(1977), 尊經閣本 訓蒙字會 새김의 索引, 睡蓮語文論集(釜山女大) 5. 金正六(1964), 訓蒙字會 漢字音 硏究, 臺彎 政治大學 碩士學位論文. 金正憲(1982), 訓蒙字會 漢字音 硏究, 中央大 碩士學位論文. 金智勇(1966), 尊經閣本 訓蒙字會, 한글 138. 金鎭奎(1989), 訓蒙字會의 同訓語 硏究, 仁荷大 博士學位論文. 金希珍(1987), 訓蒙字會의 語彙的 硏究 -字訓의 共時的 記述과 國語史的 變遷을 中心으로-, 淑明女大 博士學位論文. 金希珍(1988), 訓蒙字會의 語彙敎育에 관한 考察(1) -名詞 字訓의 類義關係 構造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59 60 합병호. 南廣祐(1956), 자모 배열에 대하여 -훈몽자회 범례를 중심으로-, 한글 119. 南廣祐(1958), '訓蒙字會' 索引, 慶熙大論文集 1. 南廣祐(1959), '訓蒙字會' 索引, 中央大學校 國語國文學會. 南廣祐(1966), '訓蒙字會'의 漢字音 訓 硏究, 李秉岐先生頌壽紀念論叢. 南基卓(1988), 訓蒙字會 「身體」部 字訓 硏究, 中央大 博士學位論文. 민충환(1980),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의 比較硏究, 仁荷大 敎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朴炳采(1972), 李基文 著 '訓蒙字會 硏究', 人文論集(高麗大) 17. 朴炳采(1972), 訓蒙字會의 異本間 異聲調攷, 국어국문학 55 56 57 合倂號. 朴炳采(1972), 訓蒙字會의 異本間 異音攷, 亞細亞硏究 15卷 1號. 朴秉喆(1984), 訓蒙字會 字釋 硏究 -稀貴 難解 字釋을 中心으로-, 仁荷大 碩士學位論文. 朴昌海(1969), 訓蒙字會 解題, 韓國의 名著 所收, 玄岩社. 박태권(1983), '훈몽자회'와 '사성통해' 연구, 국어국문학 (부산대) 21. 方種鉉(1947), '訓民正音'과 '訓蒙字會'와의 比較, 國學(國學大) 2. 方種鉉(1948), 訓蒙字會跋, 影印本 訓蒙字會, 東國書林. 方種鉉(1954), '訓蒙字會'攷, 東方學志 1. 신정아(1958), '훈몽자회'란 어떤 책인가?, 말과 글 6. 신한승(1985), 훈몽자회 예산본ㆍ동중본 방점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安泰種(1981), 訓蒙字會 聲調의 比較 硏究, 仁賀大 碩士學位論文. 柳鐸一(1962), '訓蒙字會' 版本에 대하여, 硏究論文集 (嶺南聯合) 12. 李基文(1971), 訓蒙字會 硏究, 韓國文化硏究所.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硏究, 全南大 博士學位論文.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硏究, 全南大論文集 25. 李敦柱(1980), 訓蒙字會 漢字音에서 發見된 中國語의 영향에 대하여, 一山金俊榮先生回甲紀念論叢. 李敦柱(1985), 漢字 音味의 辯別性과 國語 字釋의 問題 -'訓蒙字會'의 釋과下註를 중심으로-, 葛雲 文璇奎博士華甲紀念論文集. 李敦柱(1985), 訓蒙字會의 '諧韻作書'에 대하여, 歷史言語學(金芳漢先生回甲紀念論文集), 전예원. 李敦柱(1985), '訓蒙字會'의 編成에 대한 再檢討, 羨鳥堂金炯基先生八耋紀念國語學論叢. 李崇寧(1965), 崔世珍 硏究, 亞細亞學報 1. 李乙煥(1982), 訓蒙字會의 意味論的 硏究, 淑明女大論文集 23. 李春實(1972), 訓蒙字會 異本間에 나타난 傍點 硏究, 慶熙大碩士學位論文. 林萬榮(1976), 訓蒙字會에 대한 考察, 忠州工業高等專門學校論文集 8輯 1號. 張周鉉(1988), 訓蒙字會의 語學的 硏究, 淸州大 碩士學位論文. 鄭然粲(1977), 訓蒙字會 釋 音 同一字의 傍点, 李崇寧博士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정영호(1962), 최세진과 훈몽자회, 말과 글 7. 정학모(1957), 훈몽자회, 조선어문 5. 周時經(1913), 訓蒙字會再刊例, 訓蒙字會 重刊本, 光文會. 崔範勳(1984), 訓蒙字會의 難解 字釋 硯究(Ⅰ), 京畿大 大學院論文集 1. 崔範勳(1984), 訓蒙字會의 難解 字釋 硯究(Ⅱ), 牧泉兪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崔範勳(1985), 新發見 '五字本 訓蒙字會'의 硯究, 素堂千時權博士華甲紀念國語學論叢. 崔範勳(1985), 訓蒙字會의 難解 字釋 硯究(Ⅲ), 具壽榮博士還甲紀念論文集. 崔世和(1985), 對馬 歷史民俗資料館 所藏의 '訓蒙字會'와 '千字文', 佛敎美術 8. 崔世和(1987), 丙子本 千字文 固城本 訓蒙字會考, 太學社. 최완호(1961), 언어문학 유산 -최세진과 훈몽자회-, 말과 글 2. 洪允杓(1985), 訓蒙字會 解題, 影印本 訓蒙字會, 弘文閣. Dirk Fündling(1987), Tiermen in Hunmong chahoe, 韓國傳統文化硏究(曉星女大) 3. |
《新增類合》은 1576년 미암 유희춘이 아동의 한자학습을 위하여 편찬하였다. 《新增類合》은 3,000자의 한자를 數目, 天文, 衆色, 地理, 草卉, 樹木, 果實, 禾穀, 菜蔬, 禽鳥, 獸畜, 鱗介, 蟲조, 人倫, 都邑, 眷屬, 身體, 室屋, 鋪陳, 金帛, 資用, 器械, 食饌, 衣服, 心術, 動止, 事物 등 27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新增類合》에 관한 연구 논저들이다.
|
南廣祐(1959), '萬曆新增類合', 국어국문학 21. 閔 濟(1974), 新增類合, 語國學 2. 민충환(1980),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의 北較 硏究, 仁何大 敎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朴秉喆(1986), '新增類合'의 漢字語 字釋 硏究, 東泉趙健相先生古稀 紀念論叢,螢雪出版社. 方鍾鉉(1946), 解題 '類合', 한글문화 1. 一蓑國語學論集 再收錄. 申景撤(1978), 新增類合의 字釋 硏究, 韓國言語文學 16. 藤本幸夫(1990), 朝鮮童蒙書漢字本 '類合' と新增類合にっぃて, アジ アの諸言語と一般學, 三省堂. |
《類合》은 영장사판 이외에도 다른 종류가 상당히 많이 간행되었으나 한자전거시스템에서는 우선 영장사판 《類合》을 입력하도록 한다. 영장사판 《類合》은 1700년에 간행된 것이다.
다음은 《類合》에 관한 연구 논저들이다.
|
白斗鉉(1988), 康熙 39年 南海 靈藏寺板 類合과, 千字文의 音韻變化, 坡田 金戊祚博士 華甲紀念論叢. 李石求(1988), 類合에 대한 國語學的 硯究, 檀國大 敎育碩士學位論文. 張光德(1972), 類合 小考 -七長寺 所藏板의 紹介를 中心으로-, 明知語文學 5. 藤本幸夫(1986), 朝鮮童蒙書 -漢字本 '類合'攷, 富山大學 人文學部紀要. 藤本幸夫(1990), 朝鮮童蒙書漢字本'類合' と新增類合にっぃて, アジ アの 諸言語と一般學, 三省堂. |
千字文의 글자에 뜻과 소리를 주석한 최초의 자료는 1575년에 간행된《光州千字文》이다. 이 《光州千字文》에는 고형의 뜻풀이가 제시되어 국어사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천자문의 대표격인 1601년에 간행된 《石峯千字文》과, 뜻을 자세히 풀이한 1752년에 간행된 《註解千字文》 重刊本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다음은 천자문에 대한 연구 논저들이다.
|
南廣祐(1958), 石峰千字文, 文耕(中央大) 5. 都孝根(1984), 千字文의 綜合的 考察, 李珊錫敎授華甲紀念論叢 都孝根(1984), '千字文' 大種 異本의 綜合索引, 語文硏究(충남대) 13. 민충환(1980), '訓蒙字會', '新增類合', '千字文'의 比較 硏究, 仁荷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박병철(1986), 千字文 訓의 語彙變遷 硏究, 국어교육 55ㆍ56 합병호. 白斗鉉(1988), 康熙 39年 南海 靈藏寺板 類合과 千字文의 音韻變化, 坡田 金戊 祚博士 華甲紀念論叢 손희하(1984), '千字文' 字釋 硏究 -難解語의 語義 究明을 중심으로-, 全南大 碩士學位論文. 손희하(1986), '千字文' 字釋 硏究(2), 語文論叢(全南大) 9. 손희하(1991), '千字文' (행곡본)의 새김 연구, 어문논총 12. 손희하(1992), '千字文' 연구, 한국언어문학 30. 손희하(1992), 영남대본 '千字文' 연구, 국어국문학 108. 申景澈(1978), 漢字 字釋 硏究, 通文館. 申景澈(1988), 七長寺本 千字文 硏究, 語文硏究(忠南大) 18. 安秉禧(1974), 內閣文庫 所蔣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書誌學 6. 安秉禧(1982), 천자문의 계통, 정신문화 12. 尹興燮(1987), 千字文에 대한 國語學的 硏究, 檀國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基文(1972),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ㆍ56ㆍ57 合倂號 李基文(1973), 千字文 解題, 影印本 千字文,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李基文(1973), 解題 千字文, 影印本 千字文, 檀國大東洋學硏究所. 李基文(1981), 千字文硏究(1), 韓國文化 2. 李基文(1986),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韓國言語文學論叢, 湖西文化社. 李敦柱(1971), 註解千字文, 博英文庫 228, 博英社. 李宇榮(1987), 千字文의 再檢討, 語文硏究 15卷 1號, 一潮閣. 鄭大煥(1981), 千字文의 訓에 關한 硏究, 啓明大 釋士學位論文. 정성희(1986), 千字文의 釋에 대하여, 국어과교육 6 (부산교육대학 국어교육연구회). 趙炳舜(1982), 原本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書誌學 7. 崔範勳(1976), 千字文 字釋 硏究 -光州版 千字文을 中心으로-, 韓國語學論攷, 通文館. 崔範勳(1983), '註解千字文'의 複數字釋에 대하여, 國語國文學論文集(東國大) 12. 崔世和(1985), 對馬 歷史民俗資料館所蔣 '訓蒙字會'와 '千字文', 佛敎美術 8. 崔世和(1986), 對馬 歷史民俗資料館藏本 千字文의 字釋에 대하여, 日本學(東國大) 5. 崔世和(1986), 丙子本 千字文 固城本 訓蒙字會考, 太學社. 崔鶴根(1980), 千字文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3. 藤本幸夫(1977), 朝鮮'千字文'とその地方性, 國語國文(京都大學) 46-4. 藤本幸夫(1980), 大東急紀念文庫所藏'千字文'索引, 朝鮮學報 97. 藤本幸夫(1980), 朝鮮版'千字文' の系統 其一, 朝鮮學報 94. 藤本幸夫(1982), 宮內廳書陵部所藏'千字文'索引, 朝鮮學報 102. |